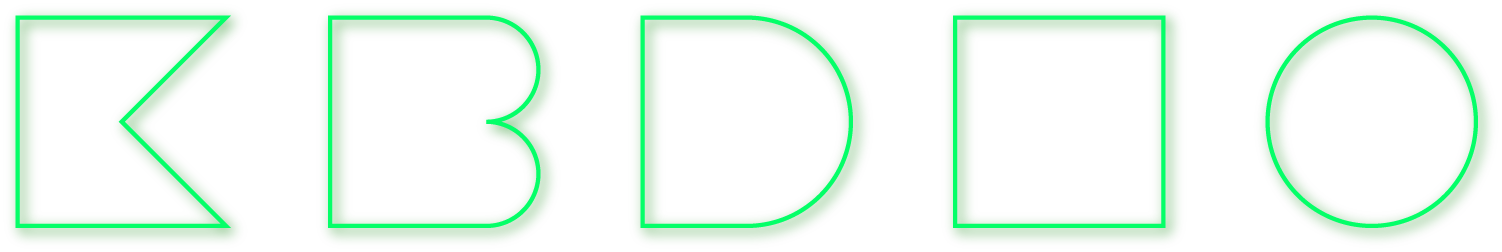유럽 4대 주요국 경제 부진으로 유로존 전체 흔들려
금리 인하 했지만…ECB 총재 "인플레이션 우려 아직 존재"

유럽 강대국들이 기술 주권과 경제 번영 둘 다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혁신적이며 값싼 제품을 내세운 중국의 기업들은 유럽 기업들이 오랜 기간 지배했던 분야들을 하나둘씩 뺏고 있다. 미국 기업들은 이미 유럽 기업들을 훌쩍 앞질렀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이른바 ‘매그니피센트7’의 시가 총액은 유럽연합(EU) 27개국 회원국 전체의 시가 총액과 맞먹는다.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4개국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데이터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G7)의 실질 GDP 성장률은 올해 4월 기준 △영국 0.5% △프랑스 0.7% △독일 0.2% △이탈리아 0.7% △일본 0.9% △캐나다 1.2% △미국 2.7% 등이다.
유럽 ‘강대국’들의 지지부진한 현주소
독일은 탄탄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때 ‘유럽 경제의 엔진’으로 불렸다. 그런데 최근 독일은 ‘유럽의 병자’란 별명을 얻었다. 독일은 2023년 기준 GDP가 약 4조5000억 유로로 EU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다.
최근 독일의 문제는 역설적이게도 자동차, 화학제품 등 제조업 비중이 20%나 된다는 것에서 발생한다. 즉 경기 사이클에 구조적으로 민감하다는 의미다. 안타깝게도 팬데믹 이후 글로벌 소비는 제품보단 서비스에 집중됐다. 또 중국의 경기침체로 인해 수출도 부진해졌다. 중국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독일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다. 작년 두 나라의 무역 규모는 2710억 달러(약 375조원)로 독일의 대중국 수출은 1040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영국은 지난해 말부터 경기침체다. 영국의 GDP는 지난해 3분기, 4분기 각각 0.1%, 0.3% 감소했다. 높은 이자율에 가계가 지출을 줄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출이 크게 감소했다.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총 상품수출은 전년 대비 152억 파운드(4.6%) 감소했다. 수입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영국에서 제조한 제품 가격이 덩달아 상승한 탓이다.
프랑스는 노동력 부족이 경제 침체의 핵심 이유로 꼽힌다. OECD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기준 OECD 회원국 근로자의 연평균 업무시간은 1752시간이다. 반면 프랑스는 1511시간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 발표된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iion) 보고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퇴직한 근로자를 대체해야 하는 필요성으로 인해 고기술 및 저기술 직종 모두에서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주 노동력에 의존해야 한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이탈리아 경제도 헤매고 있다. 최근 IMF는 이탈리아에 공공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고 단호한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IMF는 이탈리아의 공공부채가 올해의 경우 GDP의 약 140%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확장적 재정정책이 적자와 부채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 이탈리아의 위험 프리미엄을 높이고 민간 부문 투자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4대 주요국의 경제가 부진하니 유로존 전체가 흔들리는 건 당연하다.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면서 더 큰 타격을 입었다. EU 통계청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2020년 러시아는 EU 원유 수입분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공급처였다. 천연가스 의존도는 40%를 웃돌았다. 그러나 전쟁 이후로 러시아의 원료 공급이 줄면서 유로 지역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다.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유로 지역 에너지 가격은 2019년 107.02에서 2022년 157.40까지 뛰었다. 올해 2월 기준 150.72다. 치솟은 에너지 가격에 유럽의 각국 기업과 가계의 경제활동 부담이 커졌다.
외면할 수 없었던 ECB의 ‘금리인하’ 조치
주요 선진국이 힘을 잃어가자 유럽중앙은행(ECB)은 약 5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겠다고 6월 6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이날 ECB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이사회를 열고 기준금리인 리파이낸싱 금리(레피 금리)는 연 4.25%, 수신금리와 한계대출금리는 각각 연 3.75%, 연 4.50%로 내렸다.
ECB는 인플레이션 목표치 2%를 달성할 때까지 필요한 만큼 금리를 동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6월 10일(현지 시간) 정책금리를 연속해서 내리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아직 (인플레이션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임금을 포함, 단위 이윤이 어떻게 증가하고 노동비용의 일부를 흡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그리고 생산성에 대해 데이터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으로 회의에서 한 차례 이상의 금리동결이 나올 수 있느냐’는 질문엔 “가능하다”고 답했다.
ECB의 완화 조치에 대해 외신들은 ‘매파적(Hawkish) 인하’라고 평가했다. 중앙은행의 정책에서 매는 금리인상을 통한 물가안정을, 비둘기는 금리인하를 통한 경제부흥을 의미한다. 금리를 내렸음에도 ‘매파’라고 부르는 것은 그만큼 유럽 경기가 안 좋다는 의미다. 즉 ECB는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아직 존재하지만 고금리에 쪼그라든 경제를 외면할 수는 없어 내린 조치란 뜻이다.
이에 대해 폴리티코는 추가 금리인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만큼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둔화하진 않았다고 분석했다. 근래 유로존 인플레이션은 2.4%를 기록하고 있다. 2020년 1월 1.40%였던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율은 2022년 10월 10.6%로 급격히 뛰었다. 지난해 1월 8.6%로 감소세를 보이며 올해 1월 2.8%를 보였다.이번 금리인하에 대해 폴리티코는 가계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럽 모기지(주택대출)의 상당수는 고정금리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후 운동가인 줄리오 카리니는 팬데믹 기간 동안 1%의 25년 모기지를 확보했지만 금리인하 여부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ECB가 하는 일은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기업엔 호재다. 오로라 매크로 스트레이트지(Aurora Macro Strategies) 애널리스트 드미트리 발라타스는 “금리인하가 기업 성장과 투자의 여지를 더 넓혔다”고 밝혔다. 수출 기업의 경우 유로화 하락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이 유리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