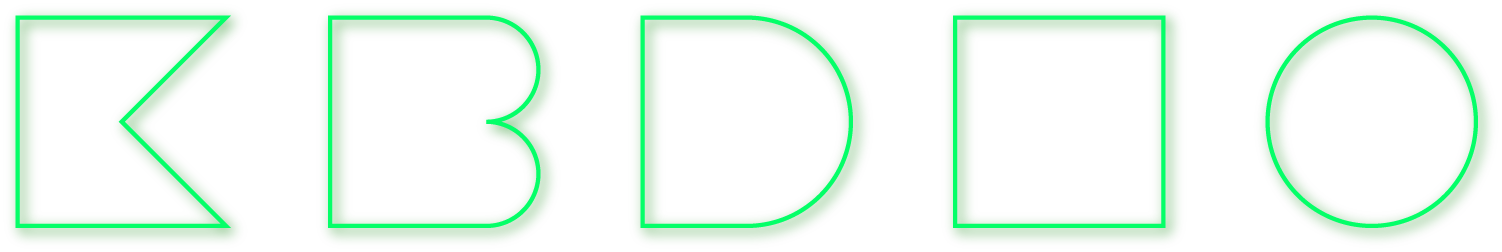미국의 ‘빅테크 기업’ 하면 캘리포니아주의 실리콘밸리가 떠오른다. 이곳에 알파벳, 애플, 메타, 엔비디아 등 굵직한 기업들의 본사가 자리 잡고 있으니 빅테크의 대명사라 할 만하다. 그런데 팬데믹을 지나면서 일각에서는 ‘실리콘밸리가 한물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글로벌 부동산 업체 CBRE에 따르면 ‘2020년 테크 기업 사무실 임대 면적 순위’에서 실리콘밸리는 6위에 그쳤다. 1위는 어딜까. 미국 서부의 시애틀이다.
스타벅스와 코스트코 1호점으로 유명한 도시지만 최근 실리콘밸리에서 출범한 기업들의 관심이 이곳을 향하면서 테크 산업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애플이 2021년 시애틀에 12층짜리 건물을 올렸고 구글도 이듬해 인근 도시 커클랜드에 빌딩 2개를 매입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인력들이 선호하는 최고 도시에 오르기도 했다. 일자리 수, 중간연봉 수준, 삶의 질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빌 게이츠의 남다른 고향 사랑
한참 전에 이곳을 미리 알아보고 사업의 본거지로 고른 CEO들도 있을까? 1975년 ‘마이크로소프트(MS)’를 공동 창업한 빌 게이츠와 폴 앨런이 미 서부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사업을 시작했고 제프 베이조스의 ‘아마존’도 1994년 시애틀에서 문을 열었다. 무엇이 이들을 시애틀로 이끌었을까.
빌 게이츠와 폴 앨런은 시애틀을 역동적인 테크 산업의 본거지로 재탄생시킨 주역이다. 뉴멕시코주 앨버커키에서 5년간 MS 사업을 이어가다 시애틀로 이사를 결정한 것은 1979년.
당시 앨버커키에서 능력 있는 기술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사를 결심하게 된 계기였다고 전해진다. 두 사람에게는 쉽게 인력을 구할 수 있는 실리콘밸리나 하버드대가 위치한 보스턴이라는 선택지가 있었지만 시애틀을 골랐다. 당시 시애틀은 석유파동의 여파로 도시의 대표 기업인 보잉(Boeing)이 휘청이기 시작하는 등 제조업 전반에 위기가 찾아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시애틀을 선택한 이유는 그곳이 두 사람의 고향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빌 게이츠는 시애틀에서 나고 자랐다. MS의 공동창업자인 폴 앨런과는 시애틀의 명문 사립고등학교인 레이크사이드스쿨 동문이다. 두 사람의 재학 당시는 1970년대 초반이었지만 학교 인프라 덕분에 컴퓨터를 접할 기회가 많았다. 게이츠와 앨런은 컴퓨터 동아리를 결성해 기업의 의뢰를 처리하며 능력 있는 전문가로 함께 성장했다.
빌 게이츠가 폴 앨런 사망 후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추모글에는 고향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추억이 드러난다. 그는 “또래 학생들이 파티에 가려고 할 때 폴과 함께 컴퓨터를 쓰기 위해 몰래 워싱턴대 연구실로 들어갔다”고 회상했다.
그의 일생을 다룬 다큐멘터리 ‘인사이드 빌 게이츠’에서는 “폴과 나는 고등학생 때부터 알고 지내다가 회사를 공동 창업했으니 초창기 MS는 가족회사나 다름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회사 이전 당시 게이츠의 가족 구성원 대부분이 시애틀에 살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유명한 변호사였으며 어머니가 주요 사교계 인사라 지역 네트워크를 최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따랐다. 후에 게이츠가 인터뷰에서 “MS 창립을 위해 하버드를 중퇴했을 때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던 이유는 실패해도 아버지가 내 편이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라고 밝힐 만큼 가족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동부 토박이 제프 베이조스가 서부로 떠난 사연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아마존 창업 전까지 미국 동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플로리다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뉴저지주의 프린스턴대에서 물리학으로 학위를 받았다. 그 후 30세까지 뉴욕 월가의 금융·투자 회사에서 경력을 쌓으며 능력을 인정받았다. 전부 미국 동부에 있는 도시다.

금융인으로서 탄탄대로를 걷던 베이조스가 낯선 서부의 도시를 창업의 본거지로 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도전과 혁신정신으로 무장한 사업가’라는 수식어로 미루어 짐작해 자유분방하고 개방적인 서부에 이끌렸을 것이란 분석도 많다. “앞으로 매년 인터넷 이용자는 23배씩 급증할 것이다”라는 기사의 한 대목에서 사업의 기획을 포착하고 즉시 실행에 옮겼으니 무리한 해석도 아니다.
1997년부터 매년 4월 아마존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도 그 근거가 된다. 2018년 편지 제목은 ‘직관, 호기심, 방황의 힘’이었다. 그는 워싱턴의 경제클럽 인터뷰에서 “사업과 인생에서 최고의 결정은 분석이 아닌 마음, 직관, 배짱에서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현실과 좀 더 가까운 이유들도 있었다. 아마존과 베이조스의 이야기를 담은 브래드 스톤의 저서 ‘에브리싱 스토어’에 따르면 베이조스가 시애틀을 고른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근처의 워싱턴대가 꾸준히 컴퓨터공학 졸업생을 배출해 ‘기술 허브’라는 평판을 가진 도시였다. 둘째, 인구가 캘리포니아·뉴욕·텍사스보다는 적어 세금 부담이 작았고 마지막으로 대형 서적 공급업체 잉그럼(Ingram)과 가까웠기 때문이다.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시애틀로 많은 테크 기업들이 모이는 이유도 크게 다르지 않다. 워싱턴대가 시애틀의 많은 기업과 산학 협력 등을 맺으며 인력을 제공하고 있다. 주 정부와 시도 실리콘밸리의 약점이라 꼽히는 교통 인프라와 생활비 등에서 강점을 내세우고 있다. 또 시애틀은 뉴욕, 실리콘밸리와 다르게 개인 소득세가 없다는 점도 이점으로 꼽힌다.